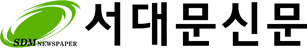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기존 지역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정책은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부동산 가격을 하늘 높이 치솟도록 하고 기존 주민의 터전을 빼앗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기존 지역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정책은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부동산 가격을 하늘 높이 치솟도록 하고 기존 주민의 터전을 빼앗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이와 같은 도시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존 도시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은 구도심과 쇠퇴지역,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정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도시재생 대상지역 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스페인 바스크지방의 몬드라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성공한 도시의 좋은 예다. 15세기 이후 철강과 금속 산업이 발달했던 몬드라곤은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면서 인구의 80%가 떠나고 산업이 붕괴됐다. 이 도시에 새로 부임한 호세마리아 신부는 학교를 세우고 졸업생들과 함께 1956년 ‘울고’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것이 몬드라곤을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도시로 키워낸 원천이었다. 현재 몬드라곤협동조합은 250여개 관계 기업에 7만4천여명의 조합원을 둔 스페인에서 7번째로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11개, 협동조합 123개, 마을기업 5개, 자활기업 6개 등 145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곳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 △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 통합지원 △홍보와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다져오고 있다.
서대문구의 모래내시장은 신흥 주거지인 가재울뉴타운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모래내시장 재개발에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한다면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기존 시장 상인과 새롭게 입주한 가재울 주민이 함께 주축이 되는 협동조합 형식의 대형마트를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주민과 상인 간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뒷받침 된다면 서대문 협동조합도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협동조합이란 개념은 낯설지 않다. 오래전부터 농촌에서는 두레라는 협동체를 통해 서로 노동을 나눠왔다. 현대사회에 오면서 두레정신이 많이 희석됐지만 이 두레정신을 되살려 쇠퇴하는 도시를 주민과 상인이 함께 상생해 살려 나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에서만 가능한 현실이 아니다. 서대문 협동조합도시가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한 한국의 대표모델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